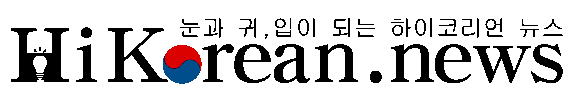[SF=하이코리언뉴스] = 여행계절이 왔다. 우선 아이들이 방학을하니, 몇개월 동안 학습에 매달리었던 것이 안쓰러워서 어딘가 먼곳에 데리고 가서 머리좀 식혀주고 싶은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실은 학교가는 날은 아주 적다. 따지면 1월부터, 설날이라고 놀고, 대통령날이라고 놀고, 마틴루터킹의 날이라고 놀고, 스키타는주라고 놀고, 봄방학이라고 놀고, 메모리얼 데이라고 놀고, 여름방학은 일찍하고 개학은 늦게하고, 학교는 가는날보다 안가는날이 더 많아 보인다. 그래도 다들 여름방학 여행을 간다고 한다.
 Credit : iTALiA Agenzia Nazionale del Turismo 이탈리아 관광청
Credit : iTALiA Agenzia Nazionale del Turismo 이탈리아 관광청
지금은 비행기표 구매, 호텔예약이 다 어렵고, 관광지의 각종 입장권도 미리 사놓지 않으면 먼곳까지 가서 허탕치게 된다. 더구나 길고도 길었던 코로나로 인한 감금에서 해방되어, 올 여름은 관광객이 더욱더 붐빌것이다.
우리 노인들은 일년내내 자유로운 몸이니 한여름은 피해서 여행을 계획하라고 옆에서 조언한다. 나는 반대한다. 어디를 가든 바글바글한 곳에 서봐야 노인들도 여행온 느낌이지, 혼자 다니는 여행은 재미없다. 가는곳마다 줄도서고, 군중들속도 헤쳐 보아야 여행온거 같지, 쓸쓸한 길거리나 한적한 호탤로비는 유배 온것같은 느낌이다. 여행은 여행계절에 가야한다.
어느 한 친구의 말이, “여행은 아는 만큼 즐긴다,” 라고, 미리 공부를 하라고 한다. 요즈음 모든 정보가 손끝에 있는게, 구글 잠간 두들기면 가고자하는 관광지의 자료가 쏟아져 나온다. 반면으로 다른 한 친구는, “알면 머리가 아프다. 그냥 가보자.” 한다. 누가 옳은가?
재정적으로 여유 좀 있고, 시간도 매일 비어있는 황혼기에 세상 구경좀 하려는데, 아!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쑤시고, 요기가 아프고 조기가 쑤신다고 한다. 호전되기를 기다려 봤자 조건은 악화되어 갈거다. 지금 가야 한다.
그럼 어디를 가야하나? 알프스산봉을 오르나? 북극을 혹은 남극을 가보나? 페루의 마추핏추를 올라가 보나? 이짚트의 피라밋을? 아프리카의 싸파리? 소련의 붉은광장? 런던의 버킹햄궁전? 파리의 에팰탑? 스페인의 알암브라? 나는 올해의 여행을 이태리로 선정했다.
이태리는 도시가 크고 작고 상관없이 모두 아름답고 볼것이 가득하다. 빨간 기와지붕이 빽빽히 들어앉은 도시들의 운치가있고, 로마때 부터 내려오는 고풍건물이 가는곳 마다 건재해 있고, 다빈치나 마이켈안젤로도 쉽게 볼수있고, 단테가 산책했던 아노강위의 고풍다리, 로마황제의 별장이었던 카프리섬, 1700년 만에 찾아낸 잿더미 속의 폼페이, 인파에 밀려 아무것도 볼수없는 로마시, 메디치 가문의 재력과 위력으로 세워놓은 근대문화의 탄생지 플로렌스, 로미오와 쥴리엣이 사랑에 빠지자 죽어야만 했던 베로나, 물에 잠긴 베니스, 등등 어느 한곳도 버릴데가 없는 나라가 이탤리이다. 음식도 하나같이 맛나다.
하지만, 이태리의 가장 강력한 매력은 음악이다. 인류의 모든 음악이 이탤리에서 탄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것이, 음악적인 용어는 모두 이태리 언어로; 알레그로, 안단테, 스타카도, 레가토 등등이 있다. 또, 그토록 사랑을 받는 오페라는 푸치니와 베르디를 포함하여 대부분이 이탤리 작곡가의 작품이고, 100년이 조금 넘는 테너의 총역사상, 우뚝솟은 별들은 카루쏘부터 시작하여 파바로티까지 모두가 이탈리아 가수이다.
이태리에서 왠만한 도시의 주택가를 걷다보면 누군지 목청을 뽑고 가곡을 부르는 경우가 종종있다. 나는 눈에 띄고 싶지않아서 남들과 같히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갔지만, 너무 듣기좋은 노래와 목청이었다. 확실히 “테너의 나라” 이다.
언젠가 누가 보내온 비디오 한장면이 머리에 떠오른다. 이태리 어느 도시의 고층 건물 숲속에서, 한 남자가 발코니의 문을 열고 나오더니, “싼타루치야” 를 꼽는다. 첫줄이 시작되자 그앞의 아파트에서 또 누가 발코니문을 열고 나와 다음구절을 받아 이중창으로 나가더니, 여기 저기 다른 발코니에 하나씩 나와서, 결국 대여섯명이 목청을 신나게 뽑아 합창으로 노래를 끝낸다. 그리고는 “챠오,” 하고 손을 살짝 흔들고 각자의 집안속으로 사라진다.
똑같은 건물 숲속의 미국 어느도시에서 한 성악가가 똑깉히 발코니 문을 열고 나오면서, “오 쏠레 미요” 를 뽑았다. 두어군데 다른 발코니에서 문을열고 남자들이 나오더니, 노래하는 가수에게 맥주병들을 던지었다. 나에게는 잊을수 없는 희극의 장면이었다.
이런저런 추억이 가득한 이태리를 재방문하기로 계획을 세우고는, 구글을 두들겨 보니, 쏟아지는 새로운 정보에 머리가 아파왔다. “에라, 그냥 가보자,” 하고 Lap Top 을 닫아버렸다. 알아도 알아도 알아야 할게 많은걸 절실히 느끼면서.
칼럼출처 : 김풍진 변호사 < pjkimb@gmail.com >